
이 책은, 드물게, 착하지 않다. 저자가 정직하게 적어간 이 글은 죽음의 공포를 날것으로 생생하게 전해준다. 때 이르게 찾아온 죽음을 저주하고, 벗어던질 수 없는 삶의 미련과 회한에 몸부림치며, 어린 딸이 자신을 잊어갈 것에 통곡한다. 자신에게 ‘편안한 죽음’을 허용치 않는 경직된 사회에서 날선 비판을 서슴지 않으며 마지막까지 화해하지 않았던 그는 죽음이 한발씩 다가오는 것을 눈을 부릅뜬 채 직시하고자 했다. 심지어 스위스 조력죽음 단체의 도움도 거부하고 친지와 가족을 멀리 물린 채, 자택에서 홀로 때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 자기만의 방식으로 죽음을 맞이했다. 옮긴이 말 중에서
<나의 죽음은 나의 것>을 쓴 작가는 우리에겐 생소한 이름이지만, 생전 그는 그리스에서 언론인이자 작가로 활동했다. 2015년 9월 간암 말기 판정을 받고, 2016년 9월 자살로 생을 마감한 그는 이 책을 자신의 그의 ‘최후 기록’으로서 죽음을 맞이하는 자신의 상태에 대해 쓰고 있다.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지만, 죽음을 맞이하는 상태를 글로 적기란 쉽지 않다. 그리고 대부분 그런 글들은 이 책을 옮긴 김보문 선생님의 말처럼 ‘착한 책’이다. ‘집착을 내려놓고 공포를 넘어서서 어떻게 세상과 화해하고 떠났는지를 보여’주는 ‘착한 책’들이다.
그러나 이 책은 ‘착하지’ 않다. 죽음을 거부하는 것이 아닌, 죽음을 스스로 선택하게 해달라고 말한다. 그는 스위스의 ‘조력자살’을 ‘애초부터 마음속에 품었던 해결’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그 절차에 드는 비용도 무시할 만한 액수가 아니다. 처음부터 마음에 품어온 이 비상탈출구를 놓치게 될까 봐 나는 두렵다. 미칠 듯한 분노와 유린된 자의 겸허함으로 나는 지금 이 말을 한다’라고 적고 있다. 그리고 그것마저 놓고, 자신의 방법으로 삶을 마무리한다. 그는 ‘우리 사회가 안락사에 관해 숙고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책을 출간했다고 생전 인터뷰에서 말했다고 한다.
이 책을 번역한 최보문 선생님은 가톨릭대 의과대학 명예교수이며, ‘인문사회의학연구소장’ 등을 지낸 분이다. 선생님은 해설 ‘ ‘죽을 수 있는 권리’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알렉산드로 벨리오스에 대해, 그의 죽음에 대해, 그의 책에 대해 그리고 무엇보다 조력죽음과 안락사, 자살 등에 대해 비교적 길게 이야기한다. 역사 속 안락사 논쟁, 안락사를 두고 일어나는 논쟁들 등등. 그러다 보니 번역한 선생님의 해설에 더 깊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작가의 서문 대신 ‘옮긴이의 말’이 맨 앞에 나오는데 그 제목 역시 ‘죽음은 누구의 것입니까?’이다.
이 책을 번역한 동기는 이런 죽음도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어서였다. 죽음 자체는 존엄하지 않다. 또 집착을 내려놓고 해탈한 듯 죽어가는 모습만이 아름다운 것도 아니다.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죽는 것도, 공포와 혼란 속에서 죽는 것도 다 인간의 모습이다. (중략) 진정 존엄한 것은 죽어야 할 숙명이라는 이 난공불락의 하루에 앞서 매일을 꿋꿋이 살아가는 우리네 삶이며, 같은 숙명을 짊어지고 고통받는 타인에게 다가가는 실천적 연민이다.
건강하게 오늘을 살 때는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는 문제. 이 책을 읽는 내내 고통을 참을 수 없어 먼저 떠난 이들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출처] 알렉산드로 벨리오스 <나의 죽음은 나의 것>|작성자 생각을담는집






![[독서 3] ‘책 읽기’가 아니라 ‘읽기’부터](https://datacdn.soyo.or.kr/wcont/uploads/2024/06/14102017/%E1%84%80%E1%85%A1_1_620.jpg)

![[일상] 새벽을 여는 사람들에게는 새벽이 오지 않는다](https://datacdn.soyo.or.kr/wcont/uploads/2024/04/13091627/%E1%84%89%E1%85%A2%E1%84%87%E1%85%A7%E1%86%A8-%E1%84%8E%E1%85%A5%E1%86%BA%E1%84%8E%E1%85%A1_620.jpg)
![[AI와 함께] 봄을 연주하다](https://datacdn.soyo.or.kr/wcont/uploads/2024/03/26135756/%E1%84%80%E1%85%A1%E1%86%BC%E1%84%80%E1%85%A1%E1%84%85%E1%85%AE_620.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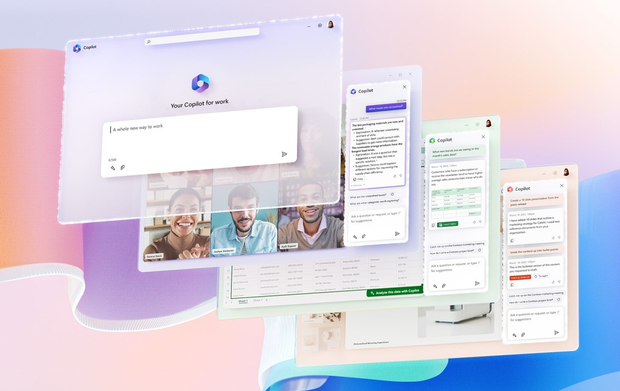
![[일상] 진주의 오래된 찻집](https://datacdn.soyo.or.kr/wcont/uploads/2023/12/10080123/%E1%84%8E%E1%85%A1%E1%86%BA%E1%84%8C%E1%85%B5%E1%86%B8_620.jpe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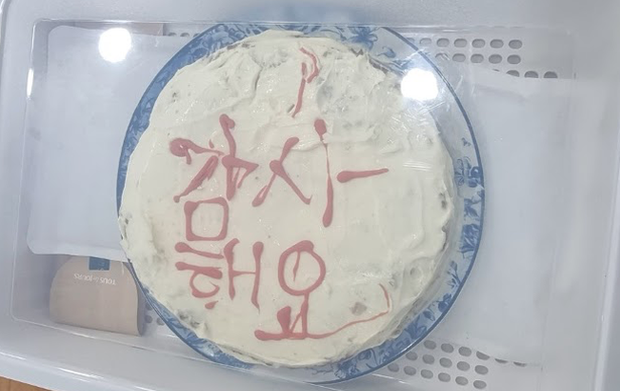
![[교육 or 고육] “남자 인어는 없니?”](https://datacdn.soyo.or.kr/wcont/uploads/2023/09/02104338/%E1%84%8B%E1%85%B5%E1%86%AB%E1%84%8B%E1%85%A5%E1%84%80%E1%85%A9%E1%86%BC%E1%84%8C%E1%85%AE_620.jpe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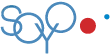
댓글을 남겨주세요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