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그런 데 가기 싫다고 얘기했잖아요! 벌써 몇 번째에요!” 진짜로, 정말 몇 번이나 싫다고 말하고 있는 걸까. 보통 이쯤 되면 슬슬 지쳐서라도 요구를 들어 주기 마련이지만, 두 달 동안이나 버텨 왔던 이모답게 이번에도 갈 수밖에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도리어 요구를 하고 있는 은하가 지쳐 나가떨어질 지경이었다.
“싫다고 말해도 이젠 안 돼. 요양하는 동안 나온 병원비 같은 것 때문이 아냐, 너도 이해해야지. 작년에 너도 그만 다니고 싶다고 말했잖아.”
“아예 안 가면 안 돼요? 퇴원하고 나서 별일 없었잖아요.”
“무슨 일이 또 생길지 어떻게 알아? 가서 사람들도 좀 만나고 그래야지.”
은하는 몇 마디 더 하려고 했지만 그 말을 꺼낼 일은 없었다. 이모는 더 말하기 싫다는 듯 문을 닫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은하는 벌컥 짜증을 부리며 소파에 몸을 던졌다.
특수학교라고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특수학교나 다름없는 상주(相做)고등학교는 이른바 장애인들이 모이는 학교다. 상당한 수준의 의료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 다른 학교와 큰 차이는 없고, 단지 특수학급의 비율과 관리 상태가 굉장히 높은 수준일 뿐이지만 은하의 집에서는 지하철로 1시간이 넘는 거리에 있는, 은하로서는 고려도 하기 싫은 선택지인 셈이었다. 물론, 일반고에 남는 것도 은하는 전혀 반기지 않았다.
아무런 대화도 없는 두 주가 흐르고, 해가 떠오를 때쯤 은하는 밍기적밍기적 짐을 싸기 시작했다. 싫다고 말은 했지만, 이미 결정된 사항이니 안 갈 수도 없지 않은가. 은하는 콱 도망쳐 버릴 만큼 적극적인 아이는 아니었다. 중학교 때도 기숙사 생활을 했으니 여행가방에 들어갈 물건은 익숙했다. 옷, 세면도구, 책 몇 권, 지갑, 핸드폰과 이어폰. 교과서는 도착하면 지급해 준댔으니 정작 캐리어에 들어가는 건 얼마 되지 않았다. 식기까지 챙기고 난 뒤 은하는 가방을 닫고 검은 후드티와 청바지를 입은 뒤 현관문을 열었다. 이모와 이모부에게 한 마디 인사도 없었다.
여름이 슬슬 지나가는 것 같으면서도 후덥지근한 날씨는 여전했다. 은하는 지하철 표를 끊으면서도 주변을 이리저리 힐끔거렸다. 열차가 출발한 뒤에도, 격렬한 헤비메탈이 흘러나오는 이어폰을 귀에 꽂고도 은하가 주변을 힐끔거리는 데에는 그럴 만 한 이유가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지하철을 한 번 갈아타고 마침내 상주고등학교가 있는 역에서 내리는 동안 그 역을 오가던 수많은 사람들의 애써 못 본 채 하려는 시선이 은하를 훑어보았다. 은하는 졸음을 쫓으려 눈을 비비면서 천장의 이정표를 바라보았다. 그 눈가와 얼굴의 거의 3분의 1을 검붉은 흉터가 뒤덮고 있었다. 소매 밖으로 드러난 맨손도 마찬가지였다. 마치 반쯤 마른 찰흙을 억지로 뭉개 균열을 만든 것처럼, 콘크리트로 포장한 길바닥처럼 갈라지고 일그러져 있었다. 은하는 3번 출구로 나갔다. 언덕길을 오르는 동안 위쪽에 상주고등학교의 건물이 모습을 드러냈다.
은하는 정문에 들어서자마자 급히 주변을 살폈다. 다행히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은하는 이어폰을 빼고 후드를 벗은 뒤 제대로 손질하지 않아 헝클어지기 시작한 머리칼을 대충 손으로 더듬어, 자신의 기준으로는 그런대로 보기 좋게 만들었다. 그래봤자 화상을 입은 부분을 가렸을 뿐 다른 부분은 거의 바뀌지 않았지만.
은하는 다시 걸음을 옮겨 유리문 중 하나를 밀고 들어갔다. 그 건물 왼쪽에는 기숙사가, 기숙사의 중간층에는 초록색 십자가가 붙어 있었다. 은하는 그것이 보건실이 아닌 학교에 딸린 병원이라는 것을 며칠이 지나서야 알게 되었다. 일단 지금은 교무실로 가야 했다.

Photo by Thibault Debaene on Unsplash
교무실은 2층이었다. 무사히 도착하기는 했지만 은하는 캐리어 손잡이를 손에 모아 쥔 채 굳어 버렸다. 담임선생님이라고 안내를 받은 남자가 뭐라 말을 했지만 은하는 그 중 반도 알아듣지 못 했다. 그나마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은 ‘전학’, ‘서류’ 정도였다. 언어의 문제가 아니었다. 은하의 귀는 지극히 정상적으로 작동했고, 입도 마찬가지였다. 문제가 있다면 다른 부분일 것이다. 은하는 몇 초 정도 후에 겨우 메마른 대답을 끄집어냈다.
“가방은….”
“음, 기숙사 청소가 아직 안 끝났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어야겠는걸. 불편하면 필기구 같은 것들만 빼 두고 교무실에 놔뒀다가 찾으러 오렴.”
은하는 고개를 저었다.
“그냥 제가…가지고 다닐게요.”
180cm가 넘어가는 훤칠한 키 때문에 은하는 고개를 올려야 겨우 눈을 마주칠 수 있었고, 그의 그런 점이 은하는 맘에 들지 않았다. 머리카락이 흘러내려 흉터가 드러나는 탓이었다. 선생님은 뭐라고 더 말을 하려다가 입을 다물었고, 이내 둘은 교실로 향했다.
문이 열리자 교실에 가득하던 말소리가 순식간에 사그라졌다. 은하는 교탁에 올라서자마자 급히 흉터를 가리려 손을 올렸고, 그럼에도 손가락 사이로 검붉은 자국이 드러난 탓에 교실 안의 반응은 극과 극으로 갈렸다. 아이들 틈에서 겉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놀람과 동정의 시선이 퍼졌다. 소수의 아이들만이 진심 어린 환영의 눈짓을 보냈다.
“김은하입니다…잘 부탁드립니다.” 다른 소개는 없었다. 다들 당황한 모양이었지만 은하는 신경 쓰지 않고 빈자리에 앉았다. 곧 수업이 시작되었지만 어느 수업도 은하에게 흥미를 일으키지 못 했다. 정확히 말하자면, 은하는 수업을 이해할 수 없었다. 당연한 일이었다. 친척 집에 얹혀살며 중학교를 나오고 고등학교 1학년을 보내던 중 덜컥 병원에 입원해 버렸으니. 은하는 두 달 정도 입원해 있었고, 퇴원 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전학이었다. 이모는 전문 의료진들이 머물고 있는 상주고등학교가 열악한 집에서 사는 것보다 더 나을 것이라 했지만, 은하는 어느 정도 속내를 눈치 채고 있었다. 은하라는 짐덩이를, 볼 때마다 슬퍼지는 아픈 조각을 떠맡은 기분일 것이다. 그러니, 이제 은하는 버림받은 것이나 다름없었다. 은하는 이를 악물었다. 그렇지 않을 것이라 믿으면서도, 겨우 눈물이 흐르는 것을 참을 수 있었다.
수업이 끝난 뒤의 늦은 오후, 전학생이라면 꼭 듣게 되는 질문, 즉 어디에서 전학 왔느냐, 취미가 뭐냐, 은하의 경우에는 어쩌다 흉터가 생긴 것이냐 같은 질문들이 쏟아졌지만 은하는 독서를 좋아하냐는 질문에 좋아한다고, 음악 듣는 것도 좋아한다고 한 것을 빼면 어떤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았다.
“이만 가도 될까?” 은하의 한 마디에 말을 못 하는 건지 노트에 질문을 적어 보여 주던 아이가 급히 물러났다. 은하는 누구에게도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도망치듯 교실을 빠져나왔다. 이제는 쉬고 싶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채웠다. 은하는 전날 받았던 서류를 펼쳐 보았다. 기숙사 방 번호는 기억하던 데로 203호였다. 은하는 하루 종일 따라다녔던 캐리어를 끌고 점점 어두워지는 하늘을 배경으로 서 있는 기숙사 문을 열었다.
학교가 끝난 뒤라 그런지 로비는 아이들로 북적거렸다. 은하는 열쇠를 받는 동안 얼굴의 흉터를 손으로 가렸지만 수위는 은하에게 눈길도 주지 않았다. 203호 문에 열쇠를 꽂아 돌리자 문이 열렸다.
방 안은 흰색 벽지와 흰 커튼 탓에 창백해 보였다. 책상과 침대, 옷장도 있었지만 그뿐이었다. 은하는 짐을 풀다 말고 그 침대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구식 병원 침대처럼 차갑고 낡은 느낌이 드는 침대였다.
짐은 내일 마저 풀어도 되니까. 은하는 그렇게 생각하며 내일 가져 갈 학용품 몇 개를 책상 위에 놓은 뒤 8월 달력 중간에 한 줄을 그었다.
새로운 장소에 올 때마다 날짜를 세며 줄을 긋는 것은 은하의 버릇이었다. 어디에 있던 그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
러닝셔츠와 속옷 차림으로 침대에 몸을 던지자 부스스한 생머리가 어깨를 덮은 흉터와 배게 위에 어지럽게 흩어졌다. 은하는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린 뒤 몸을 돌려 벽을 향했다. 몇 분 뒤 은하는 잠들었지만, 밤새 숨을 몰아쉬며 뒤척였다. 불을 끄지 않아 형광등 빛이 드리우는 방 안에서 꼭두각시 인형처럼 힘없이 움직이는 은하의 모습은 귀신과도 같았다.






![[독서 3] ‘책 읽기’가 아니라 ‘읽기’부터](https://datacdn.soyo.or.kr/wcont/uploads/2024/06/14102017/%E1%84%80%E1%85%A1_1_620.jpg)

![[일상] 새벽을 여는 사람들에게는 새벽이 오지 않는다](https://datacdn.soyo.or.kr/wcont/uploads/2024/04/13091627/%E1%84%89%E1%85%A2%E1%84%87%E1%85%A7%E1%86%A8-%E1%84%8E%E1%85%A5%E1%86%BA%E1%84%8E%E1%85%A1_620.jpg)
![[AI와 함께] 봄을 연주하다](https://datacdn.soyo.or.kr/wcont/uploads/2024/03/26135756/%E1%84%80%E1%85%A1%E1%86%BC%E1%84%80%E1%85%A1%E1%84%85%E1%85%AE_620.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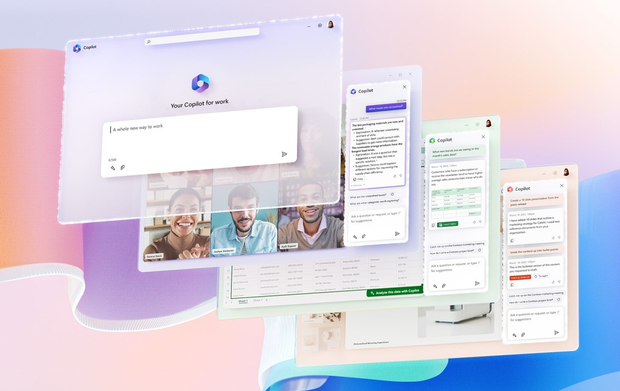
![[일상] 진주의 오래된 찻집](https://datacdn.soyo.or.kr/wcont/uploads/2023/12/10080123/%E1%84%8E%E1%85%A1%E1%86%BA%E1%84%8C%E1%85%B5%E1%86%B8_620.jpe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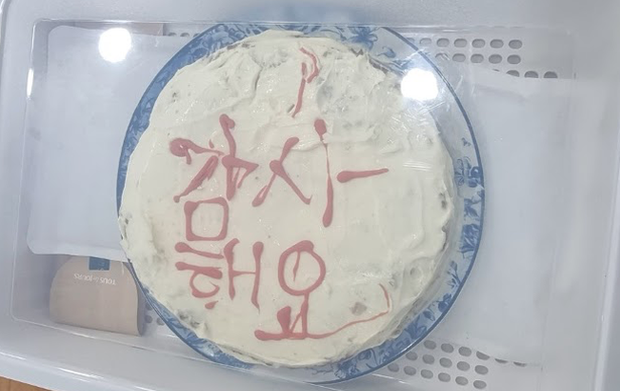
![[교육 or 고육] “남자 인어는 없니?”](https://datacdn.soyo.or.kr/wcont/uploads/2023/09/02104338/%E1%84%8B%E1%85%B5%E1%86%AB%E1%84%8B%E1%85%A5%E1%84%80%E1%85%A9%E1%86%BC%E1%84%8C%E1%85%AE_620.jpe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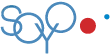
아….전 화상묘사 몰입해서 읽었습니다.
상처들이 눈에 보이는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