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도서부는 그만두는 거야?” 유리가 물었다.
겨울방학이 되고, 은하는 유리의 집에서 머물게 되었다. 당분간 줄어들 느긋한 시간을 유리와 보내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아무래도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가족의 정을 다시 느끼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았다. 일종의 애정에 대한 그리움과 갈망이었다.
“응, 사진촬영부가 어떨까 싶어서.”
“하는 거야 네 자유긴 한데…왜?”
은하는 대답을 미루었다. 심심하다며 온 집안을 뒤져 찾은 오래된 CD에서 익숙한 멜로디가 흘러나왔다. 사이먼&가펑클의 ‘Sound of Silence’였다. 유리 역시 이 곡의 도입부는 들어본 적 있었다.
“도서부…내가 크게 하는 일도 없었으니까. 사진촬영부에는 정현도 있고….”
하긴, 파손된 장서 정리는 굳이 누군가가 전담으로 할 정도로 큰일은 아니었다. 그리고 굳이 하는 동아리라면 아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더 나은 법이다.
“그렇구나. 그럼 사진 쪽으로 정해 보려고?”
“잘 모르겠어, 하지만….” 은하는 창밖을 내다보느라 말을 잠시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었다.
“응, 아마 그럴 거 같아.”
이후 한동안 음악 소리만이 침묵을 채웠다.
사진을 좋아하지만 찍는 것을 망설였던 이유인 수전증은 많이 나아졌다. 그 이외에도 종종 은하는 자신의 변화에 놀랄 때가 있었다. 여전히 적기는 했지만 이전보다 더 자주 웃게 되었고, 무엇보다 시도 때도 없이 가슴을 짓누르던 공포가 줄어드는 것이 느껴졌다. 하지만, 이 작지만 확실한 변화에 은하는 가끔 두려움을 비췄다.
“저기…사실 잘 모르겠어. 예전보다는 지금이 나은 것 같지만, 너무 너한테 의지하는 것 같아…정말 괜찮을까?”
은하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요즘 너무 무서울 때가 있어…네가 사라지거나 하면 난…어떻게 살아야 해?”
유리는 아무 말 없이 시선을 땅으로 향했다. 그러더니 무언가 결심을 한 듯 은하를 향해 손을 뻗었다. 잠시 뒤 은하의 자그마한 어깨가 품으로 들어왔다.
“나도 모르겠어…그냥, 그럴 때는….”
은하의 입술이 목에 닿았다. 따뜻했다.
“글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거 같아. 억지 부리지 말고. 내가 사라져도 네가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 네 가치가 그런 것들하고는 다른 곳에 있다는 걸 알잖아….”

Photo by Issara Willenskomer on Unsplash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독서 3] ‘책 읽기’가 아니라 ‘읽기’부터](https://datacdn.soyo.or.kr/wcont/uploads/2024/06/14102017/%E1%84%80%E1%85%A1_1_620.jpg)

![[일상] 새벽을 여는 사람들에게는 새벽이 오지 않는다](https://datacdn.soyo.or.kr/wcont/uploads/2024/04/13091627/%E1%84%89%E1%85%A2%E1%84%87%E1%85%A7%E1%86%A8-%E1%84%8E%E1%85%A5%E1%86%BA%E1%84%8E%E1%85%A1_620.jpg)
![[AI와 함께] 봄을 연주하다](https://datacdn.soyo.or.kr/wcont/uploads/2024/03/26135756/%E1%84%80%E1%85%A1%E1%86%BC%E1%84%80%E1%85%A1%E1%84%85%E1%85%AE_620.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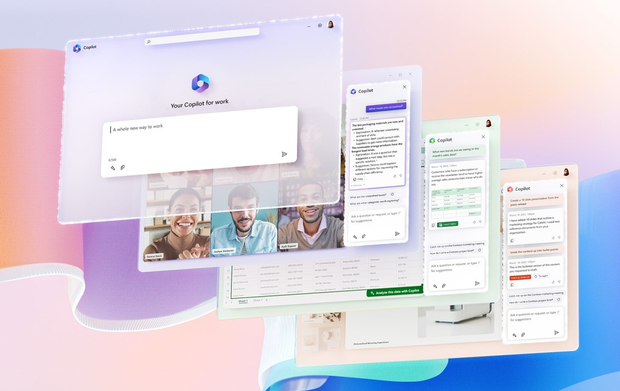
![[일상] 진주의 오래된 찻집](https://datacdn.soyo.or.kr/wcont/uploads/2023/12/10080123/%E1%84%8E%E1%85%A1%E1%86%BA%E1%84%8C%E1%85%B5%E1%86%B8_620.jpe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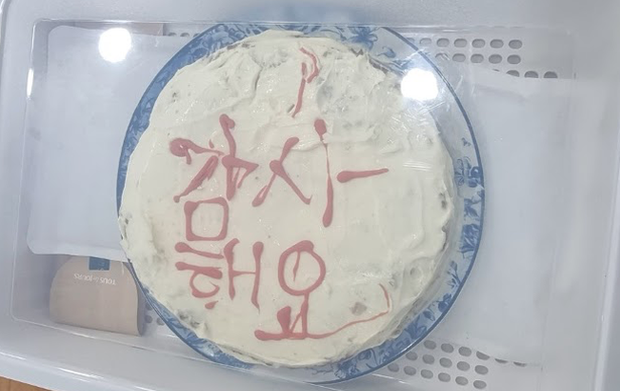
![[교육 or 고육] “남자 인어는 없니?”](https://datacdn.soyo.or.kr/wcont/uploads/2023/09/02104338/%E1%84%8B%E1%85%B5%E1%86%AB%E1%84%8B%E1%85%A5%E1%84%80%E1%85%A9%E1%86%BC%E1%84%8C%E1%85%AE_620.jpe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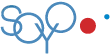
댓글을 남겨주세요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