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끔 트럭을 타고 오는 할아버지가 계시다. 이런 비밀스러운 곳을 당신이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휴식이 된다는 분. 처음에는 아메리카노 한 잔을 시키고 내 책장에서 낡은 책 한 권을 보다 가셨다. 어느 날 말씀하셨다.
“나, 그냥 믹스커피 주면 안 돼요? 통 쓰기만 해서.”
그래서 믹스커피를 드렸다. 우리 카페에 믹스커피가 있는 이유다.
처음에는 3천원을 받았다. 그러다 어느 날 책을 한 권 사셨다. 내 책 <시골책방입니다>였다. 이후 오실 때마다 책을 한 권씩 구입하셨다. 당연히 믹스커피는 서비스가 됐다.
며칠 전 새로 나온 나의 <나는 이제 괜찮아지고 있습니다>를 사 갖고 가셨다. 그리고 긴 문자가 왔다.
참 좋은 날씨입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기다리며. <나는 이제 괜찮아지고 있습니다>와 함께하는 시간이 감사하다.
번뇌로부터 보호받는 느낌이다.
소중한 시간을 주신 작가님에 무한 감사 보냅니다. 건강한 등대 되어 청정하고 맑고 환한 등불 끊임없이 생산 정진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일상생활의 소박한 글 거듭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는 문자 앞에서 망연했다. 내가 시골책방을 하면서 괜찮아지는 이유, 괜찮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또 이렇게 늘어나는구나.
산문집 <나는 이제 괜찮아지고 있습니다>는 내가 시골에 들어와 책방을 하면서 지내온 이야기다. 독서 모임을 함께하는 친구가 어느 날 책을 읽으며 점점 괜찮아지고 있다는 말을 듣고 그 말을 생각하며 책 제목을 생각했다. 그리고 물론 다른 제목도 몇 개 생각했다. 그런데 편집을 하면서 원고를 읽다 보니, <나는 이제 괜찮아지고 있습니다>라는 제목 외에는 다른 제목이 딱히 떠오르지 않았다(나는 출판사도 하고 있다.) 시골에 살면서, 책방을 하면서 나는 정말 괜찮아지고 있구나, 깨달은 것이다.
이번 책 추천사는 나처럼 동네책방을 하는 사람들에게 부탁했다. 우리 책방의 가장 오래된 단골인 용인 노란별빛책방의 김지영, <시골책방입니다> 책을 냈을 때 북토크를 했던 파주 헤이리 술딴스북카페의 술딴, <시골책방입니다>를 인연으로 이곳까지 방문했던 당진 오래된미래의지은숙, 어느 날 직원들과 함께 왔던 부산 책과아이들 강정아, 그리고 책방 문을 열자 달려왔던 괴산 숲속작은책방의 백창화. 책방을 하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관계를 맺게 된 이들이다.
이들은 원고를 먼저 읽고 위로받았다고 했다. 캔맥주 같다고도 했다. 겨우내 움츠렸던 자신도 괜찮아지고 있다고 했다. 책방을 하는 이들의 말은 내게 큰 위로와 힘이 됐다. 다른 누구보다 형편을 가장 잘 헤아리는 이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제를 ‘시골책방에서 보내는 위로의 편지들’이라고 붙였다. 누군가 이 책을 읽고 위로를 받을 수 있다면, 생각했다.
편집이 끝나고 인쇄 제작 넘겼는데 인쇄소 대표님이 연락이 왔다. 2쪽이 모자라 맨 뒤에 빈 페이지라는 것이다. 인쇄 종이는 4배수로 떨어져야 하는데, 262쪽이었던 것이다. 두 쪽을 채워 넣든지 두 쪽을 빼든지 해야 했다. 어차피 내가 쓰고 만드는 책, 두 쪽을 쓰면 되지. 그래서 에필로그를 썼다.
아, 그런데 이 에필로그 쓰기가 또 만만찮았다. 이미 이런저런 말을 다 하고 서문도 썼는데 에필로그로 무엇을 써야 하나. 그래도 써야 하니 컴퓨터 앞에서 자판을 두드렸다.
“집 마당에서 꺾어 왔어요.”
누군가 꽃을 내밉니다. 누군가 쑥떡을 내밀고, 누군가는 고추를, 누군가는 머위대를 내밉니다.
누군가 제가 읽은 책을 구입해 갑니다. 어떤 지점에서 우리는 만날까 생각합니다.
누군가 저와 함께 글을 씁니다. 그가 돌아가면 그의 글이 저를 일으켜 세웁니다.
시골에서 책방을 합니다.
괜찮은 날들이 많아지고, 나는 괜찮아지고 있는 중입니다.
도시에서 살 때도 괜찮다 생각했습니다. 밥벌이를 할 때도 괜찮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밖으로 나돌았습니다. 원형탈모증과 위장병을 달고 살았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그냥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돼요. 숨을 좀 쉬고 싶을 때 여기가 생각나요.”
비로소 알았습니다.
내가 사랑을 받고 있구나. 시골책방을 찾는 사람들로부터 내가 사랑을 받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괜찮아지고 있구나.
에필로그를 쓰기 전까지는 몰랐던 사실이었습니다. 에필로그를 쓰면서 비로소 알았습니다. 내가 괜찮아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이유가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이어서 썼습니다.
제가 괜찮아지고 있는 것처럼 당신도 괜찮아졌으면 합니다. 부디 아프지 말고, 우리 함께 괜찮은 사람이 되어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마지막 글을 쓰는데 눈물이 핑 돌았다.
그리고 책을 냈습니다. 표지는 숲속에 둘러싸인 우리 집을 그린 그림이다. 사방이 초록인 계절이라 지금과 꼭 맞다.
책을 읽은 이들이 고백한다.
“선생님, 사랑합니다!”
사실 저는 대놓고 그런 말을 못한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해주는 이들이 있으니 좀 민망하지만 좀 좋다. 이 나이에, 이 시골책방에서 이런 고백을 받다니.
오늘 아침에도 이런 문자가 왔다.
‘늘 건강하세요. 그곳은 나의 쉼터입니다.’
오늘을 삽니다.
내일의 나는 또 어떤지 모른 채 오늘을 삽니다.
오늘 하루 괜찮게 살아내면 되겠지요.
우리 함께 괜찮아져요.
대놓고는 못하지만, 고백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포천좋은신문)
[출처] 우리 함께 괜찮아져요|작성자 생각을담는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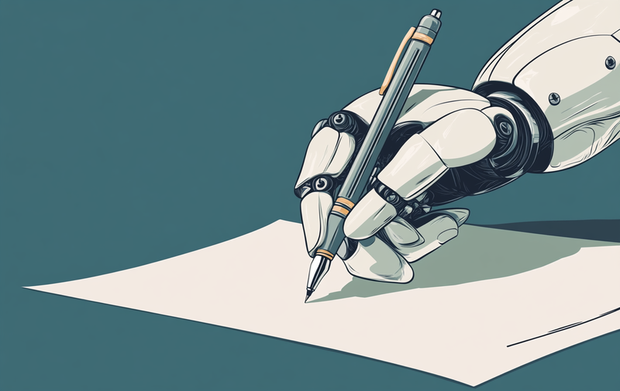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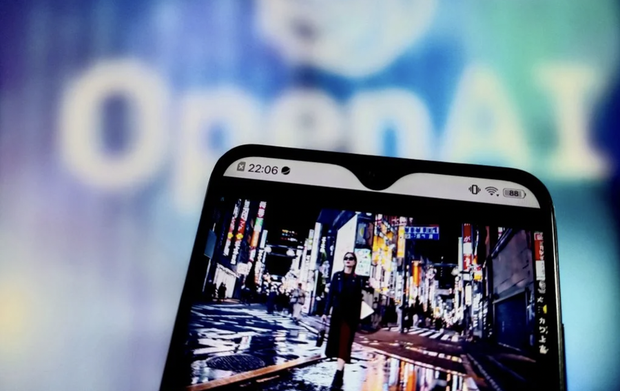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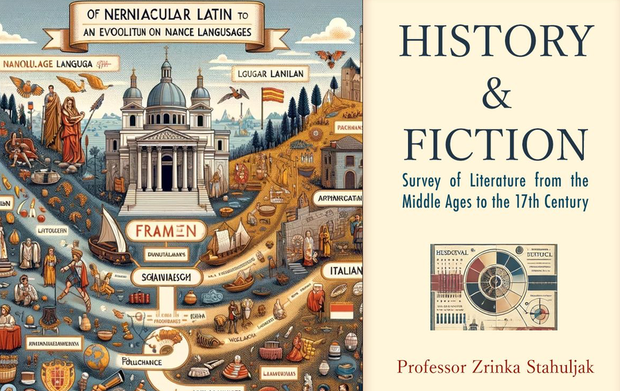



![[번역]AI보다 훨씬 먼저 ‘비판적 사고의 쇠퇴’가 우리를 죽일 것이다.](https://datacdn.soyo.or.kr/wcont/uploads/2024/11/24135433/0_%E1%84%87%E1%85%B5%E1%84%91%E1%85%A1%E1%86%AB%E1%84%8C%E1%85%A5%E1%86%A8-%E1%84%89%E1%85%A1%E1%84%80%E1%85%A9_620.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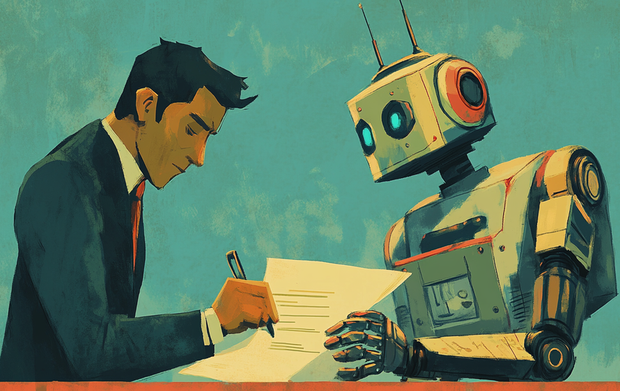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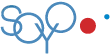
항상 글을 읽으면 인생의 여유나 뒤돌아봄이 느껴집니다. 물끄러미 지켜보고 바라보는 여유…
현재 제게는 없는 모습입니다. 머릿속으로 생각해 본다 한들 가슴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니 안다고 만들 수 있는 여유도 아닙니다.
그래서 글을 읽고 느껴지는 이런 따뜻함이 좋습니다. 그 순간의 나라도 잠시 겹쳐질 수 있어서요.
멋진 단어, 젠체하는 문장들로 있어보이려는 나는 아닌지 돌아보게 되네요.
진심이 담긴 글은 어려운 단어 하나 없이 가슴이 따뜻해지는데 말이죠.
‘오늘을 삽니다.
내일의 나는 또 어떤지 모른 채 오늘을 삽니다.
오늘 하루 괜찮게 살아내면 되겠지요.’
이 문장은 읽고 그냥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현재의 제가 뭐 그닥 힘들지 않은데도 위로가 되는 말이에요.
‘괜찮아 지는 삶’이라니 너무 감사하네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와우~~
대놓고 못하지만, 따뜻해지는 글 참 감사합니다^^
저 또한 괜찮아지고 마음이 따뜻해 집니다. 육아를 하면 지쳐갈때 아이들을 보며 위로받고 “그래도 괜찮아 “하며 최면을 걸며 육아만 하면서 7년을 살아 왔습니다. 근데 정말로 괜찮아 지고 있다는게 느껴집니다. 따뜻한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고 엄마로서 변화하는 자신을 통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