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밤새 온 눈이 낮 동안 많이 녹았지만, 아침 풍경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아름다웠다. 사진으로 담는 것은 나의 한계다. 있는 그대로를 넘어설 수 없는 것은 나에겐 사진뿐 아니다.
가난했던 부모는 나에게 기술을 배워야 평생 먹고 산다고 했다. 40년 전 어떤 기술을 배웠으면 잘 먹고 잘 살았을까. 끝내 기술 대신 문학을 선택한 나는 간신히 살아남아 지금 분에 넘치게 살고 있는데.
착한 딸이었으나 나는 착하지 않았다. 순종하는 딸이었으나 사실 순종하지 않았다. 오래 그것이 마음에 걸렸으나 나에게 착함과 순종을 요구했을 즈음의 당신들 나이를 지나고 보니 그것을 거부했기에 오늘 내가 나로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닫는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성실하다는 말에 나는 반대한다. 성실했으나 학교 공부를 못하는, 1등 이외의 수많은 학생들은 불성실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제도 안에서의 성실과 불성실이 행복 여부를 판가름할 수는 없는 일이다.
부모에게 저항하는 자식은 부모로서 아플 수밖에 없다. 남들처럼 공부할 때 공부하고, 취직할 때 취직하고, 결혼할 때 결혼해서 애 낳고 그 애까지 똑똑하게 척척 살면 부모들이 좀 좋겠는가. 그럼 그 부모들은 나가서 말한다. 아유, 우리 애가 말이야‥ 라고.
그러나 나는 최소한 자식자랑과 남의 자식 비난을 하면서 늙어가고 싶지 않다. 최진영의 소설 <이제야 언니에게>서처럼 그런 말을 듣고 있을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미쳐버릴 것만 같다’.
내가 비록 그 유명한 작가 마그리트 뒤라스는 아니지만 나도 그처럼 내 자식이 남들처럼 새벽 알람소리에 깨어나서 ‘이름 모를 사무실의 포로가 되기보다는 빈털털이가 되는 게 좋’다. 방황하고 가난한 게 좋다. 빈털털이였던 나도 지금 배 부르고 등 따숩게 살고 있는데 내 자식도 ‘남들처럼’만 생각하지 않고 살 수 있다면 그게 더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일이 아닐까.
따지고 보면 자식도 남이다. 아니, 내가 아니면 모두 남이다. 내 인생을 살아야 남의 인생도 보인다. 너나 잘하세요. 가르칠 것은 없고, 배울 것 투성인 세상에서 내가 사는 게 더 중하고 중하다.
오늘은 설날. 혼자 있는 아들이 며칠 전 다녀간 후 오늘 일찍 오기로 했는데 늦게 왔다. 술을 먹고 늦잠을 잤고, 급하게 움직이다 그만 지하철에서 휴대폰을 떨어뜨려 박살났다. 휴대폰이 안 되자 잠시 패닉 상태에 빠진 아들은 다시 자신의 방으로 가서 컴퓨터 카톡으로 연락을 했다. 현금은 없고 카드도 지갑에 들어가 있는 상태. 아들이 있는 곳에서 우리 집까지는 지하철과 시외버스를 갈아타고, 다시 데리러 가야 하는 거리. 그런데다 저녁엔 서울의 상갓집도 가야 하는 상황.
아들은 어찌어찌 집에 왔다 세배하고 다시 상갓집을 향해 갔다. 시외버스를 기다리며 아들이 말했다.
참 오늘 같은 날 면목이 없네요. 저 때문에.
집에 돌아오자 식구 중 누군가 말했다. 진짜 상갓집 갔을까? 그리고 누군가 말하고 떠났단다. 난 아니다에 한 표.
설 잘 지내라고 연휴 전날, 한 친구가 와인을 갖고 왔었다. 그 맛난 와인을 좀 마셨다. 말이 많아진 이유다.
난 아들이 좋다. 아들 바보다. 때로 나도 의심한다. 그러나 저 나이 때의 나를 생각하면 나보다 낫다. 그러니 의심을 거두고 믿는다. 발등을 찍는 것은 믿는 도끼지만, 그렇다고 나무를 쪼개지 않을 수 없는 일. 나는 도끼 없이 나무를 쪼갤 수 없다. 새 도끼는 안전한가? 도끼는 내 발도 찍을 수 있지만 훨씬 더 많은 나무를 쪼갠다. 찍힌 발등의 상처는 다시 회복되게 마련이고.
[출처] 믿는다는 것과 배려에 대해|작성자 생각을담는집






![[독서 3] ‘책 읽기’가 아니라 ‘읽기’부터](https://datacdn.soyo.or.kr/wcont/uploads/2024/06/14102017/%E1%84%80%E1%85%A1_1_620.jpg)

![[일상] 새벽을 여는 사람들에게는 새벽이 오지 않는다](https://datacdn.soyo.or.kr/wcont/uploads/2024/04/13091627/%E1%84%89%E1%85%A2%E1%84%87%E1%85%A7%E1%86%A8-%E1%84%8E%E1%85%A5%E1%86%BA%E1%84%8E%E1%85%A1_620.jpg)
![[AI와 함께] 봄을 연주하다](https://datacdn.soyo.or.kr/wcont/uploads/2024/03/26135756/%E1%84%80%E1%85%A1%E1%86%BC%E1%84%80%E1%85%A1%E1%84%85%E1%85%AE_620.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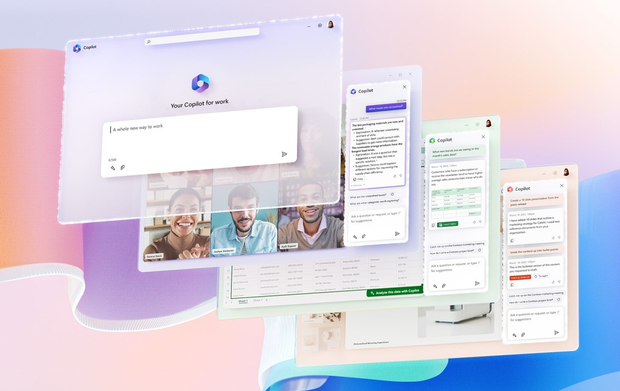
![[일상] 진주의 오래된 찻집](https://datacdn.soyo.or.kr/wcont/uploads/2023/12/10080123/%E1%84%8E%E1%85%A1%E1%86%BA%E1%84%8C%E1%85%B5%E1%86%B8_620.jpe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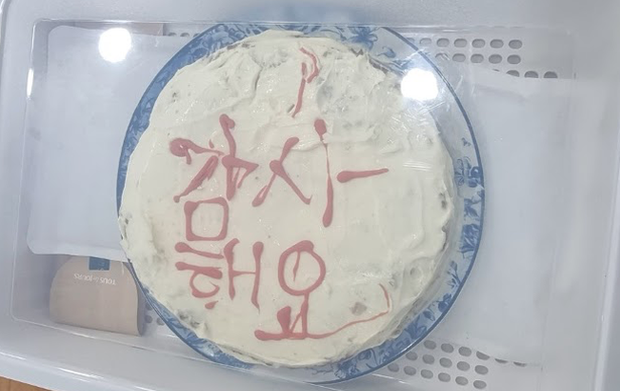
![[교육 or 고육] “남자 인어는 없니?”](https://datacdn.soyo.or.kr/wcont/uploads/2023/09/02104338/%E1%84%8B%E1%85%B5%E1%86%AB%E1%84%8B%E1%85%A5%E1%84%80%E1%85%A9%E1%86%BC%E1%84%8C%E1%85%AE_620.jpe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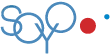
믿는 것과 배려라고 해서 타인에 대한 시선이라고 생각했는데, 가족이네요^^
물론 가족도 남이지만, 그래도 남과 같진 않습니다.
올해 17세 되는 딸이 요즘 너무 귀여워 죽을 것 같거든요.
한 7살짜리 어린아이를 보는 것 같아서요.
장난기와 애교 섞인 재롱이 사랑스럽습니다.^^
가끔 딸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지만, 저와 쌓아온 시간을 돌아보면 이유가 있겠지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냥 믿는 거지 배려라고 생각했을 때의 내가 참는 부분? 은 별로 없네요.
저절로 참아지는 걸까요?
세상 모든 인간관계가 딸과의 관계처럼 말랑하다면 세상 살기 참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아침입니다.